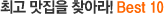| ||||||||
|
||||||||
|
Home > 요리 > 테마요리 > 맛집 베스트 |
|
||||||||||||||||||||||||||||||||||||||||||||||||||||||||||||
|
|
   |
‘나락 놀짱흘 때’ 제대로 든 | ||||||||||||||||||
|
||||||||||||||||||
http://cook.pruna.com/view.php?category=Q0wNNFE7VSpCNQxJT1U%3D&num=Eh5HcxE%3D&page=8

|
||||||||||||||||||
| "항! 여가 다~ 바다였어. 울 엄니 아부지도 발도 하고 갯일도 하고 그랬제. 전어 같은 것은 그냥 건져다 묵었어. 옛날엔 거의 잡어 수준이었제." 광양시 골약면 고길마을 박후준씨(48)는 벌판을 바라보며 푸른 바다를 떠올린다. 백운산 옥룡계곡·봉강계곡의 맑은 물과 굽이굽이 섬진강 물이 몸을 풀어헤친 광양만이다. 여수반도와 하동반도 사이, 입구는 좁지만 속은 확 터진 항아리 모양의 바다는 천혜의 어장이었다. 온갖 고기가 알을 슬고 새끼를 치고 살을 찌워 강을 거스르거나 바다로 향했다. 차진 갯벌에서 뭇 생명이 꼼지락꼼지락 흥성하던 고향바다는 광양제철소로 메워지고, 망덕포구를 따라 늘어선 전어잡이 배들만이 가까스로 옛 추억을 타고 너울댄다. 그 바다와 갯벌이 아들에겐 머릿속 기억이지만 남상금 아짐(75)에겐 치열하게 부대끼던 몸의 감각으로 남았다.
두고두고 애석하다. 당신 손으로 거두던 흔전만전 전어를 이젠 발품을 팔아 사러 간다. "전에 모 숭글 때 되문 전어가 발에 많이 들어. 근디 음력 4월 지나 5월 되문 잘 안 사. 맛이 떨어진게. 그러문 통째로 젓을 담아서 삭흐문 국이 말금흐니 참 맛나. 글고 가실에 나락 놀짱흘 때 또 맛이 들거등. 요새 맛이 들 때여." 망덕포구 도매상과 이용호씨(61)의 횟집을 차례로 들러 깔다구(농어새끼) 세 마리가 섞인 전어 3㎏을 산다. 퍼덕퍼덕! 전어들이 요동을 친다. 비닐봉지가 금세 찢어질 것만 같다. 그물을 손질하던 이씨가 뒤통수에 대고 자랑을 한다. "강물하고 바닷물하고 교차하는 기수지역이라 여기 전어가 명품이여." 고길마을로 들어설 무렵, 하늘엔 먹장구름이 짙게 퍼진다. 구봉산 줄기 두 개가 마주보며 바다에 발을 담근 지형에 들어선 밀양박씨 집성촌이다. 아짐은 이웃마을 하포에서 스무 살에 시집와 55년을 살며 4남2녀를 길러냈다. 고샅엔 탱자나무·모과나무가 성성하고, 알갱이를 알뜰하게 털어낸 깻단들이 늘어섰다. 지붕을 낮게 드리운 안온한 시골집이다. "느그 성이는 안 왔냐? 숯댕이 좀 내놔라 했더니 안 내놨지?" 일바지에 헐렁한 셔츠로 갈아입은 아짐이 일손을 보태러 온 둘째 며느리 이금순씨(52)에게 큰며느리를 묻는다. 후준씨는 얼른 아버지 박근석씨(79)와 함께 불 지필 채비를 한다. "아이! 잔 오랑께 왜 안 와. 저녁 묵게 와." 큰며느리 김은미씨(52)에게 소환 명령(?)을 내리고 전화를 끊는다. 그러곤 칼 하나와 꽃무늬 화려한 큰 접시를 챙겨들고 수돗가에 앉는다. 팔딱이던 전어들은 진즉 수굿해졌다.
찬물에 씻은 전어를 하나씩 꺼낸다. 칼로 쓱쓱 긁어 비늘 벗기고, 지느러미 잘라내고 꼬리 떼고 반 토막을 친다. 깔다구 세 마리와 전어 세 마리는 그렇게 지짐용이다. 소금 간이 배도록 가로로 길게 한 번, 어슷하게 세로로 세 번씩 칼질을 한 건 구울 참이다. "다른 집선 남자들이 허등마, 우리 집은 다 나한테 미롸(미뤄)불고 안 해." 그 비릿한 칼질이 수만 번 되풀이되면서 저절로 손에 익은 빛나는 솜씨다. 전어 여덟 마리에 소금을 흩뿌린 뒤 석쇠 위에 가지런히 놓는다. 이제 후준씨가 숯불에 구울 차례다. "오메 어쩌야쓰까. 우산을 쓰고 해야겄네."
기어이 비가 쏟아진다. 아버지는 당신과 동갑쯤 돼 보이는 늙은 풍로를 가만가만 돌린다. 그 바람으로 벌겋게 달궈진 숯덩이 위에 전어를 굽는다. 비를 피해 마루에 앉은 아짐은 회무침할 전어를 가늘고 촘촘하게 썰면서 "매매 꾸워야 돼" "언능 돌멩이를 더 높여라" 하며 맞춤하게 지휘를 한다. 지글지글 뽀글뽀글 기름이 배어나와 질질 흘러내리고, 허연 연기가 포복을 하듯 빗속을 긴다. 집 나간 며느리뿐이랴. 살지고 비린 생선이 고소하고 맛깔나게 타들어가는 내음에 홀리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회무침용은 뼈와 가시를 바르지 않고, 창자를 긁어낸 뒤 통째로 썬다. 한 마리씩 대가리에서 꼬리 쪽으로 정교한 칼질이다. 마지막 남은 전어 하나만 가시 없이 포를 뜬 뒤 아주 가늘게 썰어 작은 접시에 따로 담는다. "요것은 아부지 드릴라고. 이가 안 좋으신게…." 지아비를 향한 지순한 정성이다. 지짐용 솥 안에 국물이 방방하다. 먼저 물부터 끓이라는 말씀을 금순씨가 잘못 들었나 보다. 생선을 이미 안치고 납작납작하게 썬 무와 함께 끓이고 있다. 아짐은 동그마한 호박 하나를 반으로 딱 쪼갠다. 칼을 조르르 돌려 속을 긁어내고 길게 토막을 친 뒤 나박나박 썬다. 솥에 고춧가루를 뿌리고 조선간장을 붓는다. "물을 너무 많이 부서가꼬 맛도 없다 이 사람아." 슬쩍 며느리 타박을 한 뒤 마늘·양파·호박을 넣고 간을 본다. 회를 버무릴 차례다. 썰어둔 전어를 냉동실에 넣어 살짝 얼린다. 큰 유리그릇에 먼저 무채를 넣고 소금을 끼얹은 뒤 설탕을 붓고 손으로 조물조물 무친다. 언제 들어왔는지 큰며느리 은미씨는 솥뚜껑을 열고 지짐 간을 본다.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가 좁은 부엌에서 복닥복닥 음식을 만든다. 회무침 그릇에 식초, 고추장, 매실 액을 차례로 넣은 뒤 무채와 전어를 섞으며 버무린다. 양파와 배를 채로 썰어 넣고 고추장과 식초를 번갈아 넣어가며 간을 맞춘다. 남은 양념으론 살점만 발라낸 아버지의 회무침을 완성한다. 며느리들은 양념장을 만들어 구운 전어에 바르고, 큰아들 박용훈씨(54)는 어두워진 밭으로 달음질을 치더니 푸릇푸릇한 쌈거리 배추를 솎아온다. 온 가족이 솜씨를 부린 밥상은 전어 요리로 풍성하다. 새콤달콤 회무침을 싱싱한 배추쌈 하는 풍미가 구성지다. 살점 맛이 스러지면 생선뼈가 고소하게 씹힌다. 구운 전어 대가리를 씹어 기어이 깨 서 말의 게미(씹을수록 고소한 맛)를 우려내고, 내장까지 끓인 탓에 쌉싸래한 국물을 아짐의 말마따나 '약이 되려니' 하는 마음으로 떠먹는다. 이제 아짐의 정든 집도 개발사업 탓에 사라진단다. 갯벌, 텃밭, 고샅, 당산…. 우리 곁에서 사라지는 것들을 생각하니 쓸개 맛이 더욱 쓰다. | ||||||||||||||||||
   |
| 총 게시글 1,286개 |
| No. | 제목 | 글쓴이 | 작성일 | 조회 |
| 1181 | 하루만에 완성하는 돈까스와 돈부리! | 편지 | 12-11-01 | 7322 |
| 1180 | 분식 창업, 노하우 전수의 장 마련 | 아카시아 | 12-11-01 | 6327 |
| 1179 | 칼슘 우렁이 | 포레스트 | 12-11-01 | 6918 |
| 1178 | 미각의 도시’에서 온 완탕면 | 제니 | 12-10-27 | 8504 |
| 1177 | 찜통에 찌는 떡&빵 | 아카시아 | 12-10-27 | 7633 |
| 1176 | 다방의 향기 테이크아웃하다 | 아픈마음 | 12-10-27 | 6578 |
| 1175 | 가을 낙엽과 함께 즐기는 대학로 거리, ‘... | ★…믿는 ㉠ㅓ㉧f | 12-10-27 | 6675 |
| 1174 | ‘나락 놀짱흘 때’ 제대로 든 | 클로버 | 12-10-27 | 5884 |
| 1173 | 가을과 어울리는 런치 타임 | 제니 | 12-10-20 | 8403 |
| 1172 | 맛집 | 달 | 12-10-20 | 7666 |
| 1171 | 도미토리 | 햇님 | 12-10-20 | 6906 |
| 1170 | 오레오스 | 아이 | 12-10-20 | 6974 |
| 1169 | [돈암동, 성신여대카페 써드플레이스] 다이어터... | 아라 | 12-09-29 | 10831 |
| 1168 | 서래마을 주택가에서 찾은 ‘괜찮은’ 퓨... | 크리스탈 | 12-09-29 | 10762 |
| 1167 | 전통의 맛과 현대적 멋의 조화 | 쿠니 | 12-09-29 | 6866 |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
 |